[마포평생학습관] 일상을 떠난 여행, 길 위의 인문학_이상욱
페이지 정보
김미령 15-07-23 10:20 조회562회 2015.07.23본문
첫 번째 이야기. 시와 헤이리 마을
수업을 마친 정끝별 시인은 나를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고 하셨다. ‘이대’ 도서관 앞에서였을까?
동경의 대상이었던 ‘시’를 이번 길 위의 인문학을 통해 만날 수 있어서 참 좋다. 밥, 돈이라는 주제의 두 편의 시집으로 맛깔나게 강의를 해주신 ‘정끝별’선생님을 도서관에서 만날 수 있어서 참 감사했다. 한편으로는 성적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강의가 아니니까 더 좋았을지도 모른다. 끝나고 나니 조금 더 횟차수를 늘린 깊이 있는 공부가 아쉬웠다는 점이다.
정끝별 선생님의 두 번의 강의 후 ‘헤이리 마을’로 탐방을 떠났다. 파주 헤이리 마을에서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에 갔다. 추억의 시간들, 헐벗고 배고팠던 시간들, 하지만 그 나름의 추억이 있던 시간들의 기억들이 떠올랐다. 학창시절 포스터대회에 작품이 뽑혔는데, 교내 대회에 보낼까 “이거 어디서 보고 한 거 아니지?” 물어보셨는데, 약간의 모방을 통한 재창조에 대해 말문을 트지 못하고, 그냥 보고 했다고 어물 어물 말했던 표현을 못했던 한 아이가 생각났다. 타자실이 있던 학교 옆에 많이 있던 팔각정 비둘기들의 주변 정리를 하며, 힘들고 무서웠던 청소시간의 기억들, 경험하지 못했던 60년대의 흔적들,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지하실에 물 차서 연탄이 다 녹아 물을 퍼냈던 기억, 비가 많이 와서, 학교에 보내기 위해 엎어서 책가방을 맨 우리 자매들을 동네 입구까지 차례로 데려다 주셨던 엄마의 모습, 엄마가 하루 외출하시면, 시계 맞춰 놓고 새벽에 연탄을 갈았던 기억, 아버지가 몇 년 간 부산 출장 가서 계실때 ‘A탕면’ ‘ㅂ면’을 계속 먹어, 질렸지만 말 못했던 기억, 부끄러움이 많고, 표현을 잘 못했던 나를 때리고 괴롭혔던 초등학교 때 남학생들, 울면 지는거다 꾹 참고 말았던 기억, 동생이 욕해서 엄마한테 일러준다고 적어뒀던 수첩을 학교에 두고 와서 담임선생님께 오해를 받았던 기억. 이발소 표지판, 새마을 아저씨께 기찻길 옆 길에 코스모스를 꺾었다고 동생 앞에서 ‘꽃도둑’이라는 모독을 톡톡히 받았던 기억. ‘참 잘했어요’ 도장을 잘 찍어주시던 옆 반 선생님과 칭찬에 박했던 담임선생님, 수두를 앓아 1달 넘게 빠진 것을 병과 처리를 안해 주셔서 개근상을 못 타게 됐던 기억, 구구단 외워 오는 것을 시키셨는데, 못한다고 친구들 앞에서 책으로 머리를 때리며 면박을 주시던 2학년 때 담임선생님 등. 억울해도 표현을 못하던 나, 내 생각은 있으나, 참고 또 참았던 학창시절의 기억들.
이 곳에서 만난 건 단지 역사적인 물건들, 시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돌아와서 나의 추억들을 생각하게 했다. 두꺼비 본 파리박물관에서는 평소 한 번쯤 경험해 보고 싶었던 동화 속 주인공되기를 해보고, 미술관에 들러서는 실제로 물을 쏟는 것 같은 장면을 연상케하는 사진을 찍으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미술관 관람이 즐거웠다. 3년 만인가? 미술관에 참 오랜만에 온 것 같다. ‘길 위의 인문학’ 덕분에 해설도 들을 수 있으니,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게 되어 기뻤다. 기대하던 초벌된 컵에 예쁘게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도서관으로 돌아 왔다. 차 안에서 가이드해 주신 선생님의 시를 듣는 시간을 갖기도 하고, 소풍 가는 전 날처럼 도시락을 준비하며, 청년 한 명과 같이 도시락을 먹었던 기억, 함께 오신다는 선생님이 안 오셔서 좀 서운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말이 없어지고 어울리는 것이 좀 쑥스러워진다던 어떤 선생님 얘기가 기억나며, 나도 그런 시기가 왔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암튼 즐거운 시간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일상을 떠난 산책<리움미술관>
<그림에 마음을 놓다, 이주은>
이주은 선생님의 4계절 강의를 듣고, 감정과 감상이 담긴 여러 작품을 보며, 뭔가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책 ‘다, 그림이다’의 ‘김 훈’의 서문에서처럼 그림의 화폭은 우리의 현실을 뛰어 넘는 세계를 그릴 수 있다. 그림 감상은 작가와 작품 속의 서로 다른 삶을 경험하는 것이며, 작품 속에 나를 발견하는 산책은 아닐까? 한남동 리움 미술관에 도착한 순간, 언덕배기에 위치한 건물의 양식부터가 뭔가 다른 느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슴작품과 작품 판매대에서부터 바깥 현실과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된 듯한 마음으로 1전시관에 들어 섰다. 사진촬영이 금지되고, 가방도 사물함에 모두 넣고, 작품을 훼손할 수 있는 막대기나 그런 소재의 물건들은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 고대에서 현대 미술로, 동양과 서양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했다.
제1미술관(시대교감)에서는 4층의 청자의 철채, 철화 등 여러 기법이 있다는 것이 신기했다. 그 중 철채 상감기법은 청자 태토로 매병 형태를 만든 후 철화 안료를 칠하고, 다시 본체 양면에 잎무늬 부분을 얇게 파낸 뒤 그 위에 백토를 바르고 청자 유약을 입혀 구운 작품이다.
3층 분청사기는 분장회청사기(粉粧灰靑沙器)의 줄임말로, 회청색의 흙[胎土] 위에 흰흙[白土]을 발라 장식하여 1200°C 정도에서 구워낸 자기를 가리킨다. 장식기법에 따라 일곱 가지로 구분되는데, 상감은 전국 각지에서 고루 사용되었지만, 인화(印花)는 경상도, 조화(彫花)와 박지(剝地)는 전라도, 철화(鐵畵)는 충청도에서 각각 특색이 있게 발전하였다. 지방의 제작지마다 토속적이고 해학이 넘치는 아름다움과 개성이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성리학을 통치이념으로 출발한 조선은 새 나라의 이상에 걸맞는 절제된 형태와 순백의 유색(釉色), 정결한 장식이 가해진 격조 높은 백자문화를 이룩하였다. 초기에는 왕실 등 지배층의 취향이 맞추어 만들어졌지만 점차 사용이 확대되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자기로 자리를 굳혔다. 백자는 순백의 흙으로 형태를 빚어 단정하게 다듬고 그 위에 빛깔이 있는 안료로 갖가지 그림을 장식한 후 표면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입혀 1,300℃ 정도에서 구웠으며 온유하면서도 엄정한 기품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었지만 경기도 광주(廣州) 관요(官窯)에서 제작된 최고급품의 왕실용 백자가 대표적이다.(미술관의 설명을 곁들였다.) 국보급 ‘백자(호)’의 여백미를 감상했는데, 지난 번 탐방 때 초벌된 것에 그림그리기를 해봐서 그런지 자기가 여러 모로 ‘백자(호)’ 작품이 아주 인상적이었다.(어쩌면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가야 하겠다는 마음이 강해서 인지도 모르겠다.)
2층 또 초상화와 김홍도, 정선, 김정희 등의 고서화 작품을 감상하고 1층 금동관 관식 등 불교미술 및 금속공예를 구경했다. ‘백자’의 여백의 미라는 평을 해 주시고, 감상을 도와주신 홍대 미대 교수님께서 서예든 미술이든 어떤 기준이 있다기보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좋은 작품이라며 감상하는 이들의 부담을 줄여 주셨다.
동양의 작품과 함께, 천정에 거울이 있어 자신의 모습이 비추는 서양 미술 작품에 마음이 끌렸다. 우리는 거기서 단체 사진을 찍었다.
제2미술관(동서교감)에서는 지하1층의 부제는 ‘인간 내면의 표현’에서 이중섭, 박수근, 알베르토 자코메티, 이인성, 권진규, 임옥상의 작품들을 보고 1층에 서는 프랜시스 베이컨, 김환기, ‘로니 혼’의 작품 ‘열 개의 액체 사건’(마치 의자로 착각하고 앉을 것 자의 같은)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다리가 아픈 일행들에겐 더욱 큰 유혹이 될 것 같았다. 2층의 부제는 ‘확장과 혼성’으로 장샤오강, 신디 셔먼, 앤디워홀, 데미안 허스트 작가들과 만날 수 있었다. 이 중 중국 등 공산주의권 국가 작가들의 붉은 색상을 많이 쓴 동양권의 미술 작품을 보며, 사상적인 다름을 느꼈고, 거울로 된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작품과 백남준씨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여러 작품들을 감상했다. 건물 밖에는 미술관을 지을 때 나왔던 돌들로 담 벽에 돌들이 하나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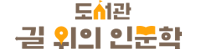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