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길 없는 길’을 따라 가는 민망함의 기쁨을 누리며! / 이태주 님
페이지 정보
윤미경 15-07-16 14:57 조회685회 2015.07.16본문
‘길 없는 길’을 따라 가는 민망함의 기쁨을 누리며!
이 태 주
‘길 위의 인문학’을 수식어로 한 “대전의 역사와 선비 문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참으로 내 자신에게 민망했다. 겸연쩍고 부끄러웠다. 예순이 넘은 지도 꽤 된 내게 이제 만나게 될 우리 고장 선비님들의 삶이 대비되어서다. 그러나 한편 늘 그리움처럼 먼 발치에서 스치며 언젠가 가까이 다가가 보겠다는 소망을 이룬 것 같아 많이 기뻤다.
이 번 탐방에 참여 하며 인문학이 길 위는 물론 길 아래 길가에 그리고 어느 방향을 굳이 문자로 표할 수 없는 도처에 산재함을 느꼈다. 단순한 노변을 지닌 길(路)이 아닌 삶의 ‘길’, 古人이 가신 삶의 여정으로 이해하고 싶었다. 또한 그 분들의 길이 이렇게 이어짐도 비가시적 후인의 정신세계에 이어짐이 아니겠는가.
첫날 한기범교수님으로부터 우리 고장 대전의 역사와 선비문화에 대한 개략적 강연을 경청하고 둘째 날 본격적인 탐방길에 나섰다. 장마철이라지만 오랜 가뭄 끝에 내리는 아직은 단비라 그리 우울하지는 않았다. 더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옛 현자를 그분들이 강학을 하고 국정을 논하며 한 자녀로서 부모로서 정성을 다한 삶의 궤적을 따라 봄이 참으로 설레게 하였다.
회덕향교에 맨 먼저 들린다. 어쩌면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공자를 비롯하여 많은 성현이 계신 곳에 우선 인사 드림이 순서이지 않겠는가? 초입 길가에 ‘大小人員皆下馬’란 입석 표지가 든든하다. ‘大聖至聖文宣王’을 뵈러 가는 걸음은 한 계단 오르고 내림이 더 없이 겸양하고 대성전 앞 몸가짐은 예의 지극함을 다해야 함을 전교로부터 배운다. 조선시대의 공립학교로서의 기능과 의례가 이만했으니 이를 강하고 실천한 선비의 삶은 그 어찌 맑고 품격을 다하지 아니 했겠는가. 40여년 가까이 중등교원을 하다 그저 무사히 퇴직하기만 결국 고대하다 그렇게 은퇴한 내자신이 참으로 민망할 뿐이다.
과문한 탓에 ‘雙淸堂’엔 처음 들렀다. 두어 번 동춘당 주변은 지나친 적이 있지만 이곳 쌍청당은 아예 생면부지였다. 그래서 더없이 민망했다. 은진송씨 대종가의 별당으로 박연과 교유하고 쌍청당 기문을 박팽년이 썼다. “천지 사이에 바람과 달이 가장 맑은 데 사람 마음이 신묘함도 또한 이와 다름이 없다. 다만 형체와 기질에 얽매이고 물욕에 더럽혀져 능히 그 본체를 온전히 보전하는 자가 드물다.……… 기상은 진실로 용이하게 형용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 더럽힘이 없는 자라야 족히 이에 해당되어 스스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기문의 서두는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송구한 마음 가눌 길 없어 가만히 쌍춘당 문설주 쓰다듬어 보며 이 문이 달과 바람을 의지하며 그 오랜 세월 풍겼을 쌍청의 정신에 기대어 본다.
松崖堂이 보수 중이라 김경여와 송애당기를 쓴 우암의 송애정신을 경청하며 한 발 비껴 오전 탐방을 마쳤다. 이만으로도 머리가 부른 데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 점심을 들며 탐방에 참가한 모두의 얼굴을 보니 참으로 밝고 아름답기만 하다. 21세기를 잊고 잠시 조선 시대 회덕 백달촌을 거닐어서이리라.
점심 후 서둘러 전민동 삼강려에 들린다. 삼강정려와 광산김씨 묘역을 보며 가문의 긍지와 면면히 이어온 뿌리 깊음이 후손의 반듯함을 인도하는 길이란 생각이 더욱 절실해진다. 김만중의 정려와 시비는 내겐 더욱 특별한 느낌을 갖게 한다. 국어교사로 재직 당시 서포의 ‘구운몽’, ‘사씨남정기’ 등을 가르치면서 순수한 한글소설로 우리 글로 어머님을 위해 쓰신 효심이 크셨던 이야기를 학생들과 나누던 시절이 언뜻 스친다. 그 때에 서포의 부모님이 이곳 대전에 계셨음을 알았더라면 보다 실감 나는 수업을 했을 텐 데 하는 역시 민망함이 앞선다. 서포선생문학비에는 ‘思親’이란 시가 이렇게 시작되고 있었다.
“ 오늘 아침 사친의 시 쓰려 하는데
글씨도 이루기 전에 눈물 먼저 가리우네.
……… . ”
오늘의 탐방 마지막은 돈암서원이다. 우리를 태운 버스는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계룡 신도시를 빠져 나가 양정고개, 개태사를 지나 논산시 연산면에 있는 돈암서원에 도착했다. 교통이 발달한 지금에도 제법 이리 먼 길을 그 옛날 조선 예학의 본산이랄 기호의 대표서원인 이곳 김장생선생을 찾아 달려왔을 송시열, 송준길 학생 등의 꼿꼿한 기상이 눈에 보일 듯하다. 그래서 더욱 겸연쩍다.
우암이 쓰신 돈암서원 묘정비에는 사계선생이 돌아가셨을 때의 심정과 인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다.
“ 羹墻江漢之思”
≪후한서(後漢書)≫ 이고전(李固傳)에 보면 “옛날 요(堯) 임금이 죽은 뒤에 순(舜) 임금이 3년 동안 사모하여, 앉았을 적에는 요 임금이 담장[墻]에서 보이고 밥먹을 적에는 요 임금이 국[羹]에서 보였다.”고 하였는데 이 마음 빌어 그 마음 전하심이라. 또한
‘江漢以濯之 秋陽以暴之(강한이 씻어 주듯 하며, 가을 볕이 쪼이는 듯하다. -공자의 큰 덕이 순수함을 비유함)’를 인용하시어 그 숭모함을 표했으리라.
“ 父子間知己”라는 그 옛날 새김이 도드라지게 보인다. 얼마나 자애롭고도 민주적인 父子인가. 늘 부족해하고 욕심껏 되지 않는 자식을 구박한 내게는 끝까지 민망케 하는 꾸지람으로 들려 부끄럽기 그지없다.
이번 ‘길 위의 인문학’ 행사에 참여하면서 내 나이에 맞지 않게 빈 껍데기뿐이라는 빈곤함을 많이 느꼈다. 그러나 고인이 걸어간 그 길의 훈풍을 다소나마 부대끼며 이제 내 고장에 긍지를 가지며 젊은 대전충청인에게 씩씩한 기상과 청풍명월의 선비정신을 길러주고 싶다. 탐방을 마친 저녁하늘은 어느 새 맑게 개어 있었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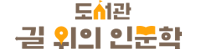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