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평생학습관] 참여후기 '길 위의 인문학'이 준 선물_안지숙
페이지 정보
김미령 15-07-09 20:51 조회573회 2015.07.09본문
‘길 위의 인문학’이 준 선물
제1차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안지숙
지난 5월 정끝별 시인이 들려주는 시(詩)의 세계를 만났다. 마포평생학습관에서 진행한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다. 최근에 무슨 유행처럼 번지는 인문학 강의이겠거니 하고 지나치려던 눈길이 팝업창에 붙잡혔다. ‘밥시’라는 단어 때문이다. 5, 6년 전 나는 ‘밥’과 관련된 ‘시’들을 껴안고 살았다. 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다큐멘터리 시민제작자로 활동하면서 ‘밥’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다. 혼자 기획과 대본작업, 촬영과 편집을 하느라 죽을 고생을 했던 3개월 동안 나는 ‘밥시’를 옆에 끼고 살 수밖에 없었다. ‘밥’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밥의 자장 속에 가둬야 했다.
그 밥을, 아니 그 밥시를, 정끝별 시인이 안내하는 인문학의 길 위에서 만났으니 느낌이 남다를밖에 없었다. 무어라고 표현해야 할까. 그래, 카메라 앵글을 통해 잡았던 밥의 이미지에 사람의 온기가 더해지는 것 같았다고 해야겠다. 밥이 곧 삶이고, 밥이 곧 목숨이며, 밥이 곧 사회의 밑그림이라는 시의 의미를 천착하면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시를 낭송하는 동안 그리움이라 불러도 좋을 웃음이 슬며시 비어져 나오곤 했으니 말이다.
6월 첫 주에 가진 헤이리마을 탐방은 ‘길 위의 인문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꾸러미였다. 두 차례의 교실 강의를 수료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선물꾸러미에서 맨 처음 나온 건 한국근현대사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자료를 갖추고 있다는 해설사 님의 자랑이 전혀 과장이 아니었다. 대폿집처럼 꾸며놓은 입구에서부터 구멍가게, 만화방, 콩나물시루가 놓인 안방, 성냥이 놓인 다방, ‘어름’집과 엿집 등을 들여다보며 한 바퀴를 도는 데 한 시간 남짓은 서운할 정도로 짧았다. 햇볕이 짱짱한 길 위에 나오자 시간여행을 하고 나온 듯 헤이리의 풍경이 묘하게 달라 보였다.
반세기에 걸친 시대의 결을 포식하고 나온 뒤, 나머지 일정은 가벼운 마음으로 치렀다. 트릭아트를 감상하고, 몇 군데의 갤러리를 돌고, 도자기교실에서 나만의 머그잔을 정성들여 만들었다.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그렇게 밥과 삶과 시간과 공간을 배치한 ‘길 위의 인문학’ 여행을 마쳤다. 물론 이것이 여행의 끝이라는 뜻은 아니다. 누군가 그랬지 않은가. 여행이 끝나고 길이 시작된다고.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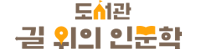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