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립마동도서관]길 위의 인문학을 걷다 - 만남-/박영학
페이지 정보
익산시립마동도서관 15-07-01 14:14 조회706회 2015.07.01본문
길 위의 인문학을 걷다
- 만 남 -
박영학
먼 길 위에 하루를 맡겨두고 싶지만 여의치가 않았다. 운전을 못 배운 탓이다. 그런 내게 마동도서관이 베푼 <문학은 역사를 담다-민중의 삶, 메아리 되어>라는 프로그램은 쉽지 않은 기회였다. 늘 머릿속에 두었던 고창 나들이가 반갑다.
우리를 실은 버스가 고창 읍성으로 달렸다. 읍성의 한 모롱이 치성(雉城)에 올라 가쁜 숨을 몰아쉬는데 방장산이 눈앞에 가지런하다. 걸음을 옮겨 맹종죽림(孟宗竹林)을 내려다보고 동리 ? 신재효(桐里 ? 申在孝 ; 1812~1884)의 판소리 기념관을 두루 살폈다. 판소리 역사를 한눈에 뀀직하다. 어지럽던 광대소리를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 가루지기타령, 토끼타령, 적벽가로 정리하고 창법의 체계를 세운 사람이 동리(桐里)라고 한다. 동리는 최초로 여성 창자도 길렀다. 그게 진채선(陣彩仙 ; 1847~?)이란다.
신재효로부터 창을 배운 진채선은 경복궁 낙성 축하연에서 스승의 작품인 ‘성조가(成造歌)’를 부른다. 좌중에 모인 청중은 크게 감동하여 환호했겠다. 당대 최고 권력자인 대원군 이하응도 탄복하여 총애 했다는 기록이 전시관 한 벽에 적혔다.
기념관과 읍성 입구 사이에 수더분해 보이는 집이 신재효 고택이겠다. 십 수 년 전에 더듬었던 <가람일기> 한 대목이 떠오른다.
익산 출신 가람 ? 이병기 시조시인은 어느 날 고창 사는 모모가 신재효의 판소리 필사본을 소장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는다. 가람은 작정을 하고 최 누구와 고창을 찾았다. 필사본 소장자를 이리 설득하고 저리 구슬려 봐도 미적거릴 뿐 도무지 보여주지도 않는다. 가람은 다시 날을 정하여 그 고장 유력 기관의 수장에게 줄을 댄다. 가람은 그렇게 빌린 필사본에 쌀말 값을 지불하고 필사를 시킨다.
나는 그렇게 읽은 가람일기를 생각하며 신재효 고택을 차근차근 둘러보았다. 방 한 칸에는 옥중가 한 대목을 배음으로 삼아 처자들의 학습 광경을 인형으로 재현해 놓았다.
사습 장면을 바라보며 나는 59살의 신재효를 상상 했다. 몸은 늙고 마음은 청춘인 신재효가 경복궁 낙성 축하연에서 돌아오지 않는 24살 진채선을 기다린다. 기다리며 그리워하다 지친 마음을 담아 신재효는 신작 <도리화가>(桃李花歌)를 창작한다. 도리화는 복숭아꽃과 자두 꽃을 이른다. 남이 천거한 어진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기도 하다.
아마 저때의 늙은 동리가 이곳 고택의 저기쯤에서, 아니면 기념관 저 편으로 이전한 사랑채에서 진채선을 기다렸을 것이다. 쉬 못 오는 사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사랑을 해 본 사람만이 안다. 진채선이 대원군 곁에서 더디게 돌아와 신작 도리화가를 배우고 부르며 무어라고 했을까. ‘우리는 너무 늦었다. 내가 당신에게 영향을 미치기에는 당신은 너무 늙었다.’ 제임스 조이스가 예이츠에게 건넨 말이다. 진채선도 그랬을까. 인정을 남겨 두면 반갑게 만날 날이 반드시 있다.
신재효와 진채선의 만남은 사설문학의 집성과 도리화가를 새로 창작하는 자양이 됐을 것이다. 예술은 연약한 두 사람의 짧은 만남을 길게 늘려주는 고무줄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뒤뜰을 돌아 앞마루 앞에 섰다. 마루 한 귀에 놓인 키 낮은 표찰에 가람이 신재효를 일러 우리나라의 섹스피어라고 높여 불렀다는 내용이 적혔다. 160여 년 전의 신재효가 문득 내 앞에 섹스피어로 다가선다. 신재효는 죽어서 가람을 만나 섹스피어로 높여진 셈이다. 만남은 이런 것이구나 싶다.
점심을 든든히 들고 선운사 입구에 이르렀다. 예전부터 동경했던 추사 김정희의 친필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해설사 곁에 바짝 붙어 백파율사비석 앞에 섰다.
이미 ‘세한도’로 널리 알려진 추사 김정희는 완당(阮堂) 이외에도 여러 가지 호를 사용했다. 추사체로 익히 알려진 김정희의 필법은 중국의 왕희지(王羲之)와 달리 독보적인 한 경지를 연출한다고 들어 온 터다. 김정희의 추사체는 중국 청대의 묵객 사이에서도 크게 대접받던 순수 국산 필법이란다.
그런데도 일제는 우리 글꼴[書體]을 명조체 ? 청조체 ? 고딕체 등등으로 이름 하여 정체성을 앗았다. 완당의 추사체는 필체이므로 묻어 두기로 하자. 훈민정음 판목을 살펴보면 독특한 우리의 서체가 보인다. 그걸 정음체(正音體), 또는 이즈음의 표기를 빌어 ‘한글체’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그렇듯 일제는 우리 글 모양의 독창성을 뭉갰다. 지금도 그런 일제 유습이 인쇄 현장에 남아 있는 현실이다.
백파율사비석에는 때가 많이 끼었다. 많은 손길이 탁본을 뜬 듯 유독 ‘대기대용’ 네 글자에 두드린 먹봉 흔적이 여실하다.
백파 율사의 비석을 서툰 독해력으로 천천히 더듬었다. 전면에는 ‘화엄종주백파대율사(華嚴宗主白坡大律師) / 대기대용지비(大機大用之碑)’라고 두 줄로 내려 새겼다. ‘대율사’와 ‘대기대용’! 이 여섯 글자가 동시에 멈춰 든다.
백파 율사는 억불 정책으로 불교가 탄압 받던 시기에 화엄종을 추겨 올렸다. 이런 시기에 지금은 우리나라 차(茶)의 시조로 불릴 만큼 유명한 초의선사와 백파 사이에 크게 불설 논쟁이 벌어졌다고 한다.
후면은 전면보다 잔글씨로 적었다. 대략 우리나라에는 율사라고 칭할만한 승려가 없었는데 백파에 이르러 가히 율사라 칭할 만하다. 세상에 격론을 폈으나 그 그릇만큼은 대기대용(大機大用)에 값할만하다는 줄거리다. 논지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마 완당이 이 논쟁에 끼어들어 백파 율사를 비판한 듯하다.
백파 율사가 죽은 후 완당은 백파 제자들의 요청에 기꺼이 붓을 잡아 비문을 썼다는 설명을 수첩에 적어 두었다. 추사가 죽기 전 1년 전이었으니 붓대를 휘두른 추사의 마지막 심회가 담겼을 법하다. 필법에 문외한인 나는 그저 덤덤할 뿐이다. 오래전부터 보고 싶은 바람을 충족시킨 눈의 호사가 즐거울 따름이다.
나는 최후의 한 붓 끝에 담았을 김정희의 회한을 생각해 본다. 추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진실로 백파의 두루 거침없이 품어 안던[圓融无涯] 큰 그릇의 넉넉한 국량[大機大用]을 폄훼한 자신의 객기를 참회했을까. 서로 필봉이 날카로웠으니 인간적 교유의 정 또한 깊을 수가 있으랴. 짐작이 안 간다. 저지르고 후회하는 것이 인간이다. 산자는 반드시 죽고 만나면 헤어지는 것이 정칙[生者必滅, 會者定離]이다.
말미에 ‘완당학사 김정희가 짓고 또 쓰다’[阮堂學士金正喜撰幷書]로 맺음한 후면의 마지막 친필 서명을 손으로 쓸어 보았다. 생전에 백파를 공격한 미안함을 담아 마지막 혼신을 다해 갈겨썼을 명필의 묵적이다. ‘대기대용’ 비석을 등지면서 나는 문득 주례사가 아닌 비문이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박물관에 보존 중인 진짜 비석은 다음 기회에 구경하기로 미루었다.
부도전을 뒤로 하고 냇물 가를 걸었다. 선운사 동구를 흐르는 냇물의 반영反影)은 전국의 사진 애호가를 불러들이기에 충분하다는 설명을 귀에 담았다. 물속에 거꾸로 드리운 푸른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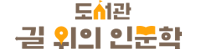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