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평생학습관] 헤이리 예술마을 탐방후기/심은하
페이지 정보
김미령 15-06-17 10:32 조회719회 2015.06.17본문
< 헤이리 예술마을 탐방기 >
심은하
답사를 가기에 적당한 날씨 같은 것을 기상청에서 정해 놓았다면 아마 이런 날씨가 아닐까 싶다. 비타민을 만들어내기에 적당한 일조량과 송골송골 맺히는 땀을 식혀줄 적당한 바람과 촉촉한 습도, 눈이 시리도록 높고 파란 하늘까지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룬 그런 날씨였다. 우리가 파주 헤이리 마을로 답사를 떠난 날은 말이다.
우리 일행은 설레는 마음들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착한 아이처럼 안전벨트까지 단단히 채운 채 파주로 향했다. 버스는 곧 도심을 벗어나 너른 들판 사이를 시원하게 달렸다. 멀리서 한강이 그림처럼 출렁이고 맞닿은 하늘에는 귀얄자국 같은 구름이 무심히 걸려 있었다. 오랜만에 보는 탁 트인 풍경에 가슴의 체증이 확 내려가는 듯했다. 멀리 산 정상에 통일전망대가 보였다. 파주에서는 맑은 날 육안으로도 북한 땅을 볼 수 있다던데 새삼 통일은 우리에게 너무나 멀리 있다는 사실이 아프게 다가왔다.
드디어 헤이리 마을에 도착했다. 서울보다 바람의 강도가 좀 더 세었는데 무척 기분 좋은 상쾌한 바람이었다. 문득 황인숙 시인의 ‘바람 부는 날이면’ 이라는 시가 떠올랐다.
아아, 남자들은 모르리/ 벌판을 뒤흔드는 저 바람 속에 뛰어들면/ 가슴 위까지 치솟아 오르네/ 스커트 자락의 상쾌//
바람에 부산하게 나부끼는 가로수의 잎사귀들이 마치 우리를 마중 나온 환영단 같다는 상상을 하며 버스에서 내려 헤이리 마을을 휘 둘러보았다. 헤이리 방문은 두 번째이지만 첫 번째 방문 때는 비가 내렸던 터라 풍경이 사뭇 다르게 느껴졌다.
그날 탐방의 가이드를 맡으신 문화예술 ‘휴’의 박재견 대표님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었는데 시를 쓰신다는 멋진 분이셨다. 그분을 따라 우리가 처음 간 곳은 한국 근현대사 박물관이었다. 솔직히 박물관이라는 말에 기대를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근현대사 박물관이라니, 교과서에나 나올법한 딱딱하고 지루한 전시물들을 보겠구나 생각했다. 그런데 웬걸, 몇 걸음 떼기도 전에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어머! 이거 나 어렸을 때 봤던 거야” “이 영화 포스터 봐. 신성일 엄앵란이야!” “어쩜 저건 진짜보다 더 똑같네.”
내딛는 한발 한발이 그야말로 과거로의 시간여행 이었다. 학창시절 지하 만화방에서 맡을 수 있었던 쿰쿰한 추억의 향기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그 때 그 시절 그 추억들이 80년대 생인 나에게도 향수처럼 다가왔다. 박 대표님 말씀으로는 이곳의 벽돌 하나까지도 모두 당시의 것으로, 이 박물관을 만드신 분이 당시 철거하는 건물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했다. 간판, 영화 포스터, 벽보, 가구나 옷들 거의가 당시의 것으로 이 박물관을 완성하는 데 무려 4년이나 걸렸다고 하니 그 열정과 수고에 감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으로 간 곳은 ‘두꺼비 본 파리 박물관’이었다. 이름부터 재미있는 이곳은 미술을 전공한 젊은 작가들이 우리에게 친근한 동화의 모티브를 벽화로 그려 그림과 함께 재미있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다. 우리 일행은 모두 동심으로 돌아가 심청이가 되어 보기도 하고 헤밍웨이의 낚싯줄에 걸리거나 걸리버 여행기의 소인국 사람이 되어 보기도 했다. 나를 포함해 처음에 쭈뼛쭈뼛하던 이들도 모두 7살 아이처럼 들떠서 사진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즐겁게 웃었다. 그러고 보면 우리는 몸만 커졌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장난기 많고 호기심 가득한 7살 아이가 살고 있는 것 같다.
꿀맛 같던 점심식사 후 우리가 들른 곳은 93뮤지엄이라는 패러디아트 미술관이었다. 전시 제목은 ‘Trick Art vs Fine Art 200점 대전’으로 개관 1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었다. 전시 제목처럼 재밌게 사진 찍고 즐길 수 있는 트릭아트와 깊이 있는 예술 작품들을 아우르고 있었다. 우리는 앞서 ‘두꺼비 본 파리 박물관’에서처럼 트릭 아트 전시실에서 재밌는 그림들을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전시실을 옮기며 여러 작품들도 감상했다. 생생하고 재미있는 대표님의 설명에, 어렵게만 느껴지던 미술이 한 층 가깝게 느껴졌다. 특히 수십 개의 판화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새긴 작품은, 작품으로서의 가치도 상당하지만 작가의 시대정신과 역사와 현실의 부조리도 느낄 수 있어 의미 있게 다가왔다. 또한 수천 개의 시계로 사람의 얼굴을 만든 ‘시간의 영혼’이라는 작품은, 시간을 시각화한 작가의 재기가 흥미로웠고 한편으로는 여유를 잃고 시간에 쫓겨 사는 내 모습을 돌아보게 했다. ‘옛사람들의 관상’이라는 테마의 전시실에서는 조선시대의 왕과 여러 사람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는데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국보급 보물들이라는 말에 더 유심히 보게 됐다. 특히 눈길이 갔던 건 우리나라 최초이며 유일한 내시의 초상이었다. 김새신이란 내시인데 임진왜란 때 선조를 호위해 공신이 되어 초상화까지 남기게 되었다고 한다. 깔끔하게 면도를 하고 차분하고 음전한 표정으로 한 쪽을 바라보는 그의 얼굴이 왕과 당대의 유명인들보다 왠지 더 눈길이 가고 오래 기억에 남았다. 그건 화려하지 않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다하는 이의 숭고한 정신이 느껴지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도 많은 곳에서 많은 국민들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 사실에 새삼 감사와 존경을 보낸다.
답사의 마지막 일정으로 도자기 체험을 했다. 애벌로 구워진 우유빛깔의 머그컵에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는데 한 때 그림을 조금 그렸던 나로서 실력발휘를 해보려 했지만 오랜만에 그리려니 쉽지가 않았다. 다들 마찬가지인지 조용한 가운데 곳곳에서 폭폭, 한숨 소리가 났다. 그래도 우리 모두는 학창시절 미술시간으로 돌아간 듯 열심히 그리고 또 그렸다. 그림을 완성한 후, 욕심을 내 시 한 편을 적으려던 나는 결국 시간에 쫓겨 안도현의 시 ‘겨울 숲에서’의 1행만을 겨우 쓰고 붓을 놓아야 했다. 그래도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내가 근래에 이렇게 집중해서 한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말이다.
단체사진을 마지막으로 헤이리에서의 모든 일정은 끝이 났다. 아니 끝이 난 줄 알았는데 역시나 ‘시와 그림, 마음에 물들다‘라는 이번 길 위의 인문학 슬로건에 걸맞게 마지막은 시낭송으로 끝을 맺었다. 오늘 최고의 가이드를 해주신 박재견 대표님의 멋진 시였다. 시낭송을 들으면서 이번 답사에 오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반나절의 짧다면 짧은 일정이었지만 그 안에서 많은 새로운 감성들이 피어나고 서로 조응하고 확장되는 소중한 경험을 했다.
인문학이라는 것, 또 예술이라는 것이 내 삶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를 자문한다면 그것은 생각과 마음의 영역을 넓히고 그럼으로써 다른 이들과 세상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것이다. 답사 전과 후의 나는 분명 조금이라도 변했을 것이고 그것이 긍정의 변화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길 위의 인문학, 인문학의 길이고 헤이리 마을에서의 길이라면 마음 놓고 한 번 길을 잃어봄직도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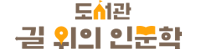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