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교육문화관] 영화와 역사, 융복합 인문학! - 1차 탐방 /김미령
페이지 정보
이은정 15-06-10 15:23 조회527회 2015.06.10본문
- 영월을 다녀와서
인문학-좀 무게감이 있어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루한 강의면 어떡하지?
길 위의 인문학 -‘영화와 역사의 융복합’ 이란 주제로 이동환 작가의 강의를 들었다.
1,2차시는 ‘교실 속 인문학’으로 내실을 다진 후 3차시 수업은 ‘길위의 인문학’이었다
길을 떠남은 ‘놓아버림’ 과 ‘만남’ 의 교차점이다.
영화 ‘관상’ 을 통해 ‘계유정난’에 대한 강의를 들어 기초적인 역사지식을 다졌고, 가족이나 삶의 터전에서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고 우린 영월로 ‘길 위의 인문학’ 여행을 떠났다.
영월에 가까워질수록 영화에서 보았던 두려움과 슬픔에 젖은 단종의 모습이 자꾸 떠올라 마음이 차분해졌다.
먼저 우리는 장릉부터 방문하였다. ‘장릉’은 조선의 6대 왕인 단종의 능이다. 몇 년 전에 가족과 함께 둘러 본 적이 있지만 그 때와 계절이 달라서 인지 또 다른 모습이었다.
잠시 단종의 모습을 그려본다. 그의 짧은 생애가 가슴이 아프다.
태어난 지 하루만에 어머니를, 12살에 아버지마저 여의며 너무 일찍 슬픔에 익숙한 생을 산 것은 아닐까. 그의 마지막 가는 길 조차 조선 왕조 500여년을 통틀어 가장 비극적인 죽음이 아닐까 생각된다.
날씨는 무더웠고 관람객들도 많았다. 우리 일행은 관람보다는 참배를 하는 마음으로 장릉을 둘러보았다. 단종의 죽음이 왕의 자리에서 승하한 것이 아니고 역적으로 몰려 맞이한 죽음이었기에 다른 왕릉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홍살문에서 정자각으로 이어지는 참도는 일반적으로는 일자형인데 ‘ㄱ' 자 형으로 꺾여 있었고 망주석에는 조선 왕릉 중 유일하게 세호가 없다는 것도 작가님의 설명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무덤조차 우리가 찾아가 볼 수 있다는 것은 엄흥도의 죽음을 무릅쓴 충절이 있어 가능한 것이었다.
엄흥도의 충절과 단종의 애절한 죽음을 뒤로 하고, 영월 동헌의 객사인 ‘관풍헌’으로 발길을 옮겼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단종이 숙부 세조가 내린 사약을 받고 죽음을 맞이한 곳이었다.
노산군으로 강봉되어 청령포로 유배되었으나 그 해 여름 홍수로 강물이 범람하자 이곳으로 거처를 옮긴 것이다. 조금 떨어진 곳에 ‘자규헌’ 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에서 단종은 ‘자규시’ 를 지었다고 한다
한 구절이 가슴에 박힌다.
‘하늘은 귀먹어 하소연을 듣지 못하는데
서러운 이 몸의 귀만 어찌 이리 밝아지는가.
17살의 소년이 아니던가. 그 어린 나이에 이토록 가슴 절절한 시를 남길 수 있었을까.
왕으로 태어났지만 숙부에 의해 죽게 되는 그의 가련한 운명이 마음을 쓰라리게 한다.
다시 우리는 길을 떠났다. 단종이 창덕궁을 떠나 7일 만에 도착한 유배지, 바로 이곳 ‘청렴포’ 이다. 청령포는 삼면으로 강물이 휘돌아 흐르고 서쪽은 암벽이 있어 나룻배를 이용하지 않고는 밖으로 나올 수 없는 천연의 감옥과도 같았다.
그 당시는 나룻배로 강을 건넜겠지만 우리들은 모터를 이용한 배를 타고 가뭄으로 물이 줄어서 인지 짚은 녹색의 강물을 건넜다. 그 해 여름도 오늘처럼 더웠으리라. 그리고 이 강을 건너며 다시는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생각하며 체념의 눈물을 흘렸을까? 강을 건너며 단종의 마음이 어떠하였을지 짐작만 할 뿐이다.
청령포에 단종이 거처한 조그만 집안에는, 반듯이 앉아 책을 읽는 그의 모습을 밀납 인형으로 재현해 놓았다. 그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600년이 넘은 소나무 한그루가 있다. 이 소나무는 단종의 유배생활을 보았으며 그의 슬픈 울음소리를 들었다 하여 ‘관음송’으로 이름지었다 한다.
이 소나무 아래에 앉아 잠시 귀를 기울여소나무의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그냥 슬프고 애잔함밖에 더 표현 할 길이 없다. 분명 17년의 인생은 자신이 선택한 길은 아니리라. 역사의 수레바퀴에 밀려 그냥 맞이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부모의 너무 이른 죽음과, 숙부의 왕위에 대한 욕심, 또 그를 위해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관직을 버린 사육신과 생육신, 사약을 건네 드리고 통곡만 할 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금부도사 왕방연.
이 감당할 수 없는 그의 아픔의 무게, 설움의 깊이가 더해져 온다. 저 소나무는 그저 묵묵히 그의 옆에 서 있어 줌으로 그의 슬픔을 받아주고, 힘들어 할 때 기꺼이 가지를 뻗어 주었으리라.
슬프지 않은 죽음이 어디 있으랴.
하지만 열일곱 소년의 죽음은 우리를 미안하게 만들고 가슴을 치게 한다.
거센 비바람에 꺾여버린 여린 꽃망울
그의 죽음에 모두 숨죽였지만
그의 슬픈 사연은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살아있어 아프게 한다.
청렴포를 휘돌아 흐르는 초록색 강물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핀 야생화들
그의 슬픔을 보고 들은 소나무들
우리는 길 위에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이번 여행의 여운은 깊고도 길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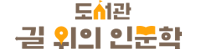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