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도서관(길위의 인문학)후기 장효선
페이지 정보
김경희 14-11-08 15:32 조회609회 2014.11.08본문
평범한 일상인과 도예 대가가 만날 수 있는 곳
장효선
저의 10월은 둔산도서관에서 진행된 「길 위의 인문학」 행사 참여로 시작되었습니다.
1차 변상형 교수님의 강연을 듣고 2차 이종수 선생님의 생가와 가마터를 탐방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인문학이란 말도 도예가 이종수라는 이름도 모두 낯설기만 하지만, 음식이든 꽃이든 뭔가가 담기면 멋지기도 한 것 같은데, 이것저것 다 빼고 도자기만 놓고 보자면 도무지 뭘 보자는 건지 모르겠다는 저의 무지함을 조금이나마 채워볼 수 있을까? 싶어 참여하게 된 행사입니다.
1차 강연에서 이종수 선생님의 삶과 그분의 작품세계에 대한 간단한 안내를 들으면서 아 정말 훌륭하신 분이구나 그것도 모르고 참여한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면서 무엇이 그분을 그렇게 대단하다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예술학교도 없었던 시절 교수라는 보장된 미래를 저버리고 대전에 내려와 평생 우리 전통 도자기 작품활동에 전념하셨다는 데, 찌그러진 항아리니 갈라진 항아리니 심심한데 그게 다가 아닌 그분의 작품까지 이해하기는 참 먼 길 같았습니다.
2차 탐방날은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몇 주가 지났지만 모든 것이 참 생생합니다. 가을 나들이 하듯 가벼운 맘으로 걸어 올라간 시골길. 우물 옆 1차 강연 때 본 사진 속에서 봤던 바로 그 주황색 지붕의 작은 시골집, 사진에서 보지 못한 사람의 손길로 하나하나 거치지 않은 것이 없을 것 같은 앞뜰, 뒤뜰,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숨겨놓은 것 같은 가마터, 작업실. 그리고 그 곳들을 이어주는 사이길들. 그리고 그림자처럼 그곳을 지키고 계셨던 사모님과 아드님.
나를 무엇보다 놀라게 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의 간소함, 소박함, 겸손함이었습니다. 너무 작고도 꾸밈 없음 앞에 당황스러웠던 것도 같습니다. 한국의 대표공예가이자 대전의 각계 예술인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다는 분, 손수 가마터를 만들고 도자기를 굽는 일을 자신의 온전한 삶으로 선택하셨고, 그분의 작품 이해 또한 그 삶과 떼어져 생각할 수 없다는데... 모든 것들이 참으로 소박했습니다.
그 소박함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작업실에선 달빛 아래 흙을 주무르는 거친 손이, 가마터에선 가마의 화기를 확인하며 묵묵히 기다리는 노장의 뒷모습이 어렵지 않게 그려졌습니다. 도예대가라는 높은 유리벽이 사라지면서 생생하게 한 사람으로 살아나는 느낌. 칠십 평생 농사만 짓다가 마지막 후두암으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신 것 없냐는 질문에 그저 농사 한해 더 짓고 싶다고 이야기하셨다는 시아버님이 겹쳐 떠올랐던 것도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간 안방에선 오랜만에 찾아온 반가운 벗들과 화폭 같은 뒤뜰의 운치를 은근 자랑하시면서 나눴을 차 한잔의 따뜻함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족을 거느린 가장의 한숨과 무게를 나눴을 뜰의 나무와 돌과 옹기들이 벗들이었을 거라는 멋대로의 상상도 하면서 거닐다보니 왠지 잘 알고 지낸 분만 같고 모든 것이 참 친근하고 날씨 만큼이나 맘이 따뜻해지고 설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과 사진 한 장 찍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이런 혼자만의 생각들이 혹여 기꺼이 맞아주신 사모님과 아드님께 실례를 범한 건 아닌가 싶어 돌아오는 길 내내 맘이 쓰이기도 했지만 그날의 여운은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우연히 지나가면 모르고 지나치고도 남을 만큼 조용하고 아담한 그 공간이 그 분의 삶을 온전히 담고 있고 작품들이 그분의 삶과 닮아 있다던 말이 생각나 실제론 한번도 보지 못했던 이종수 선생님 작품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보게 되고 다음 전시회가 열린다면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 이후 나의 무지함이 조금이라도 채워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다음번 이종수 선생님 작품전에 가게 된다면 지겹지 않게 관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듭니다.
도자학적으로 예술적으로 그분의 작품을 이해할 순 없을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그 분의 삶에서 발견한 그 경이로운 경험을 전시회장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을 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새삼 길 위의 인문학이라는 행사 이름을 되짚어 봅니다. 제 30대 마지막 인생길에 참 좋은 만남을 가지게 해준 행사였습니다. 그 길을 안내해준 도서관에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종수 선생님의 남은 작품들이 잘 정리되어 그에 걸 맞는 제자리를 찾아 미술관이라는 집을 갖게 되는 날이 빨리 찾아오길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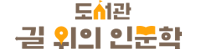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