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앙도서관- 문학속에서 인천의 두 얼굴을 만나다(김준혁)
페이지 정보
윤정금 14-10-06 13:00 조회594회 2014.10.06본문
길 위의 인문학을 처음 시작할 적에는 내가 이것을 통해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지, 또 배울 수 있을지도 잘 모르는 채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발을 내딛었다.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곳. 또 내가 태어난 곳인 인천에 관해서도 연표에 굵은 글씨로 새겨진 굵직굵직한 사건들에 관한 짤막한 지식 밖에는 간직하고 있던 것이 없었다. 내가 어떤 장소이든 잘 아는 곳이 있으려마는 내가 지금 딛고 있는 땅이기에 그 어느 것보다 현재의 내게는 의미 있는 장소일 것이다. 그런 장소에 관한 눈빛을 반짝이는 어린이의 작은 호기심으로 이 인문학이라는 목적지로의 길을 걷기 시작한 듯하다. 이 아이의 커다란 탐구대상에 관해 처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근대’라는 것이었다. 끄적거리기만 해도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그 단어에 관해 단편적인 그림을 그려내며 그 풍경화 속에 새로이 들려오는 소리들을 덧그리기 시작했다. 한쪽 구석에는 보석 같은 불빛들이 반짝이는 방의 항구를, 그 옆에는 여럿 노동자들이 저마다의 사정을 토로하는 작업 터의 한 구석을, 다른 한 편에는 낯선 이들에게 짓밟히는 해변의 모래를... 그리고 그 옆에 작게 글귀를 적어내었다. 빛나는 별들을 찬양하며. 때로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적어내었다. 인천이란 그런 곳이었다. 밤에도 고통 소리와 함께 빛나는 보석들을 간직했던 곳. 각지의 사람들이 모여 소중한 만남을 간직했던 곳. 빼앗긴 땅의 슬픔을 파도가 부딪치는 소리로 덮어내었던 곳, 시인들이 짭짤한 바다 내응을 맡으며 낭만을 노래하던 곳. 이 모든 부분들을 간직하며 인천은 현재까지 성장해 온 것이었다. 넓은 개항장의 거리를 거닐며 상상해보았다. 저기엔 청나라 사람들이. 여기에는 일본인들이 저마다 길을 걷고 있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낯설기만 한 느낌이 들었다. 양장을 입고 거니는 사내들을 생각하고 공장에서 일본인 관리자의 지시를 받으며 힘겹게 일하는 노동자들을 생각했다. 저마다 고향도 나이도 다르겠지만 필시 한국인이나 중국인이었을 것이다. 이렇듯 식민지화는 문명이라는 빛을 가져왔지만 또한 어둠도 데려온 것이었다. 하지만 문명이라는 것도 지금 와서 되돌아보면 정말 좋은 것일지 의문이 든다. 누군가 그랬던가 인문학은 의심하는 학문이라고. 내가 들은 것은 단순한 강의일 수도 있고 탐방 또한 그저 하루의 나들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를 통해 현실에 관한 의문을 가지고 탐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개인을 위한 진정한 배움이 아닐까.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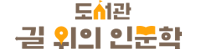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