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와 문학의 숲을 걷다 1차시, 통영 시의 향기에 취하다
페이지 정보
이영주 16-06-15 16:14 조회362회 2016.06.15본문
‘길 위의 인문학’을 떠나며
김헌수
처음 떠나는 문학여행이라 설레었는지 선잠을 잔 아침. 두근대는 가슴을 안고 향기 나는 글벗들과 함께 시립도서관으로 향했다. 토요일 오전 8시. 이른 아침부터 깨어 하루 동안 비워둘 자신의 자리를 위해 여러 가지 집안일을 미리 챙기느라 바빴을 텐데 모두가 예쁘게 꽃단장하고 사전 수업 자리로 모여들었다. 한 시간 남짓 오늘 여행하게 될 문학의 길이 선생님의 알찬 설명으로 미리 채워졌다. 지난 며칠간 한여름 같은 날씨였기에 오늘도 쨍쨍한 햇볕이 내리쬘 것이라 생각했건만 여기저기서 낮부터는 비 소식이 있다는 얘기가 들려왔다. 나는 혹시나 싶어 차에 있던 우산 두 개를 얼른 집어 들고 관광버스에 올랐다. 통영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동안 수업시간에서만 만날 수 있었던 벗들과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다. 이 또한 문학 여행의 즐거운 묘미 중 하나가 아니겠는가.
통영중앙시장에 도착하니 아니나 다를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굵어진 빗방울이 여행에서 성가실 수도 있지만, 이미 길 위에 올라선 우리에게 비는 오히려 문학 여행과 어우러져 적절한 운치를 느끼게 했다. 옛 충무에 왔으니 충무김밥은 먹어줘야지라며 점심 식사를 통영 명물로 한 후 후식으로 꿀빵을 사들고 버스에 올랐다. 통영에서 우리를 처음 맞은 길 위의 선생님은 생명파 시인 청마 유치환이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아내로부터 학창시절 유치환 시인의 '행복'을 외어 여기저기 수도 없이 적었다는 얘기를 들었다. '......사랑하였으므로 나는 진정 행복하였네라'. 아내는 그토록 좋아했던 시가 시인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여인을 향한 5000여 통의 고백편지 중의 하나였던 것을 알았을까. 수천 통의 편지를 보내기 위해 찾았던 우체국이 그녀를 먼발치에서 바라보기 위한 장소였음을 아내는 알았을까. 자칫하면 세간의 눈총이 되어버릴 수도 있었을 그의 편지는 이토록 절절한 사연과 함께 글과 문학으로 승화되어 우리에게 사랑과 행복이라는 감정을 건네주었다. 유치환 시인 생가의 처마 끝에서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고 있노라니 20년이라는 시간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던 애달픈 사랑에 가슴이 먹먹해온다.
여행길에 오르기 전 마음속에 그려보았던 것이 있었다. 글속 장면으로 들어가 주인공이 되거나, 작가가 영감을 떠올린 곳에 자리해 글을 쓰는 그들이 되어보고 싶었다. 때마침 백석 시인이 거기에 있었다. 처음 만난 '란'이라는 여인에게 푹 빠져 그녀를 잊지 못하고 쓰게 된 시 <통영2>, 충렬사 돌층계에 앉아 저 멀리 푸른 바다를 보며 사랑하는 이를 떠올렸을 백석, 나는 그가 되어보고 싶어 돌층계에 올라보려 했지만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그리고 충렬사 입구에서 내려다 본 명정(明井)은 이미 높은 돌담으로 둘러싸여 보이지 않았고, 층층이 펼쳐져 있어야 할 푸른 바다는 높은 빌딩에 가려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버스에 올라 그의 시 <통영>과 <바다>를 또 한 번 읽어본다. 그렇게 보내야만 했던 충렬사 돌층계의 백석을 나는 박경리 기념관에서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김약국의 딸들>의 배경이 되는 통영의 옛 모형도에서 충렬사와 돌층계 그리고 '란'을 떠올리게 한 명정과 저 멀리의 푸른 바다까지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초가집들 사이 높게 위치한 돌층계에 앉아 백석은 사랑하는 '란'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오늘의 길 위에서 만난 과거의 조그만 집들이 나를 애틋한 외사랑의 현장으로 불러들였다. 집에서 시집으로 수업에서 글로만 읽어서는 알 수 없는 느낌이었다. 현재와 과거를 이어주는 조그마한 그 옛날의 통영이었다.
그렇게 나를 백석과 다시 이어준 소설가 박경리는 오늘 통영의 길 위에서 만난 가장 인상 깊은 선생님이셨다. 버스를 타고 구불구불 휘어진 길을 내려가는 동안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그녀의 모습이 사뭇 기대되었다. 박경리 기념관은 저 멀리 푸른 바다와 함께 나무와 숲이 숨 쉬는 곳이었다. 통영 앞 바다 섬들의 모습을 상징화한 벽면을 바라보며 기념관에 들어섰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사전 수업시간에 미리 알게 된 박경리를 변화시킨 3명의 남성에 대해 생각해봤다. 전쟁통에 죽게 된 남편, 참여 시인 사위 김지하, 특히 어린 나이에 죽은 아들은 전쟁의 참상과 부조리한 사회를 고발하는 소설 <불신시대>를 쓰게 한다. 그녀의 진실에 대한 물음은 시 <사마천>과 맞닿아 있었다. '......엉덩이 하나 놓을 자리 의지하며/그대는 진실을 기록하려 했던가'
기념관을 나서 박경리 시인의 묘소를 향해 산길을 올랐다. 통영에 도착한 내내 비가 내렸지만 그간 맡을 수 없었던 산내음이 빗방울 속에 묻어났다. 산 중턱에 자리 잡은 묘터는 소박하고 수수했다. 상석위에 놓인 들꽃 한 송이는 박경리의 삶을 이해한 어느 방문객의 속삭임이리라. 그녀가 바라보고 있을 통영이 궁금해 돌아서니 저 멀리 충무공의 기운이 느껴지는 한산도 앞바다가 펼쳐졌고, 양옆으로 청록의 아름다운 산이 두 눈에 가득 찼다. 아, 그녀의 통영이 어느새 내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순간 오른쪽 산위를 솟아오르는 운무는 푸른 눈을 가진 새하얀 용이 하늘로 날아오르는 듯했다. 그녀 어머니의 꿈은 박경리가 살아서 그리고 죽어서도 실현되고 있었다. 풀 내, 흙 내, 나무 내 그리고 비 냄새를 온몸으로 느끼며 묘소를 내려오는 그 길 위에서 박경리 선생의 말씀이 떠올랐다. "인생에 대한, 진실에 대한 물음은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인문학의 바다에 푹 빠져버린 나는 인생의 길 위에서 끊임없이 묻고 있다. '나는 누구인가. 삶은 무엇인가' 오늘의 인문학 기행은 나에게 물음을 던졌고, 길 위에 놓인 해답을 조금 엿보여 주었다.
고맙다. 유치환, 백석, 김춘수, 박경리 그리고 통영.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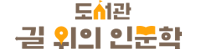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