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립 공도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참가후기(구재정)
페이지 정보
이병희 15-11-13 11:38 조회410회 2015.11.13본문
봄날, 박경리를 느껴보다
구재정
나른한 토요일 아침, 나도 모르게 새벽녘에 눈이 떠진 이후 어느새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뜻 밖의 선물이랄까? 주말 아침 여유를 선물 받은 느낌 그런 여유시간에는 주로 무심코 TV를 켜곤 했던 나였지만, 이번엔 웬일인지 햇살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책장을 서성이고 있었다. 책장 사이에는 밝은 빛의 낡은 책 하나 '김약국의 딸들' 이 햇살 사이에서 황금의 행운인양 따스한 미소를 보낸다. 마치 작가인 박경리 선생님이 온하환 미소를 보이며 손짓을 하는 것 같았다. 2015년 5월 23일은 공도도서관 주최의 길위의 인문학 탐방이 있는 날이다. 마침 아침에 눈 인사한 박경리 선생님을 찾아가는 탐방이 예정 되어있다. 유난히 떨리고 설레는 탐방이 될 것 같은 설레임 . 어는 덧 몸은 벌써 버스에 탑승해 있었고 인원체크 명단 호명에 힘찬 대답과 함께 박경리 선생님의 발자취 탐방은 시작 되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했던가 출발 하자마자 군것질을 시작한다. 도서관에서 마련해준 떡 한 덩이와 물 한 모금으로 목을 적시고 박경리 선생님을 기다린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박경리 문학공원" 박경리 선생님의 옛집을 배경으로 하얀 순결함과 정갈한 옷고름처럼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고, 뒷동산인 홍이 동산과 박경리 선생님의 옛집 그리고 박경리 문학의 집이 옹기종기 모여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공원 중앙에 스프링 쿨러가 '척척척' 소리를 내며 마치 과거로의 기차가 출발 하듯 과거의 기차를 타고 박경리 문학의 집으로 들어선다. 단아한 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박경리 선생님의 철학이 담긴 동영상을 시청하고, 간략히 박경리 선생님의 일생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본다. 참 순탄지 않고 일생이 혹독한 환경이 양분이되어 작품이 탄생 했으리라, 문학의 인생은 내리 인생이듯 아들로 이어져 가는 문학의 길이 박경리 선생님을 칭하고 있었다.
박경리 선생님의 시대를 살지는 못했으나 그 때의 생활의 고통을 생각해본다. 부유한 신여성에서 남부럽지 않은 결혼의 삶과 남편과 아들의 죽음을 맞서는 생활력과 그 모든 역경이 문학으로 쏟아내는 열정을 느껴본다. 나의 인생은 아직 반도 가지 못했지만, 인생 고락의 영향을 어느 열정이 되어 열매를 맺을까? 자신을 잡고 굳은 의지로 문학관 관람을 나선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문학관 창가 사이로 들어오는 하얀 2층 집의 옛집 그리고 그 옆에 단아하게 걸려있는 박경리 선생님. 잠시 우두커니 서서 묵념하듯 넋을 잃고 바라보곤 계단을 걸어 문학관으로 내려간다. 문학관에는 시집, 문학소설, 그리고 유품들이 전시 되어 있었다. 문학에만 열정이 있는 줄 알았던 선생님은 바느질과 예술에서도 능하셨단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바느질 사랑이 미싱기의 사랑으로 볼 수가 있었고 해설사님이 설명으로 충분히 의문점을 풀어주셨다. 작품과 유품에는 작은 설명이 덧붙여 있지만, 작은 설명이 큰 나래가 되어 상상하게 됨은 물론 작품 속으로 들어 갈 수 있는 촉매제가 되었다. 마치 토지에 배경이 되는 하동의 시골길을 걷는 듯한 생생함. 그렇게 시골길을 걷고 뛰며 박경리 문학관이 관람을 마무리하고, 옛집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해설사님 설명에 의하면 박경리 선생님의 집, 특별히 집필실은 잘 공개 되지 않는 곳 이라고 하며 걸음을 재촉했다. 옛집의 문이 열리는 순간 선생님의 기운이랄까 알싸한 냉기가 귓볼에 스치운다. 선생님이 직접 지은 집은 아니지만 참 소박하고 아늑한 집이었다. 참 선생님의 손길은 집안 곳곳에서 느껴진다. 주방이며 거실에서 소박하지만 따스한 느낌이 곳곳에 묻어난다. 집안 여러곳을 둘러보다 집필실에 들어섰다. 집필실은 원주 시내와 산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경과 햇살이 밝은 집필실이었다.
이 곳에서 토지를 완성하고 23년의 토지 대장정을 마무리 했던 곳이라 생각을 해보니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동영상에서 봤던 토지 완성 기념회가 떠올랐다. 그때의 희열 그리고 마침이라는 홀가분한 기분이 얼마나 컸을지 다시 한번 느껴본다. 집필실에서 박경리 선생님의 혼을 깊게 들여 마시고는 선생님의 필력이 나에게 들어오리라는 부질없는 희망에 심호흡을 하고 아쉬운 마음을 잡고 마당으로 나간다. 이 마당은 텃밭이 있었으나 현재는 가지런한 잔디로 꾸며져 있었고, 이 곳에서 우리의 길위의 인문학, 박경리 선생님의 발자취를 마무리하고 기념사진을 찍는다.
주최자의 인솔에 따라 나란히 줄을 선다. 그리고 서로서로를 바라보며 중앙을 맞추고, “하나, 둘, 셋”이라는 구령에 우리 모두 미소를 머금고 오늘의 추억을 남긴다. “찰칵” 찰나의 순간이 아닌 박경리 선생님의 철학과 인생사 그리고 문학의 숨결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며, 미소를 머금는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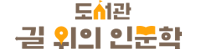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