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도서관] 제3차 탐방 후기
페이지 정보
안동숙 15-10-27 09:54 조회534회 2015.10.27본문
잃어버린 염막의 푸른 연기를 찾아서
-김내자(金內資)-
기다리던 울산 남부도서관 울산 소금길 답사 날이다. 새벽에 깨어서 하늘을 보니 짙은 구름과 연무가 가득하다.
도서관에 도착하여 대형버스를 타고 10시 30분 쯤 도착한 곳은 씽씽 차가 달리는 아산로 옆의 태화 강둑 변에 있는 억새밭이다. 염색하지 않은 내 머리카락 색깔 같은 은빛 억새들이 내 키의 두 배만한 길이로 훤칠하게 나부낀다. 그 억새밭 사이로 단단하게 매어놓은 나무 데크를 따라 걷는 것이 편안하다. 잠시 강가에 서서 1965년 울산이 공업화되기 이전의 주변 이름과 지형에 대한 설명을 강사로부터 듣는다. 이름도 생소한 명촌 대도섬 염전, 강 건너편 세양청구 아파트로부터 농수산물 시장까지 펼쳐졌던 삼산 염전, 지금은 섬 주변의 바다가 매립되어 조개섬은 간데없고 돋질산만 보이는 돋질염전. 이곳은 지형적으로 바람이 없는 곳이라 해는 뜨겁고 몹시 무덥다.
강사가 물가에서 축축한 진흙덩이를 집어다가 보여준다.
다문다문 희끗한 소금 입자가 박혀있다. 소금염전이 없어진지 반세기가 지났건만 아직도 이런 흙덩이에 소금의 잔해가 보인다. 문득 50년 전의 이곳 염밭에서 일하든 염부들이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강 하구라 나무그늘이 없고, 무풍지대라 30분 걷는 것도 이렇게 더운데 몇 날 몇일을 땡볕아래 소금밭에서 모래와 뻘 흙과 바닷물을 가지고 소금알갱이를 일으켜야하는 빈한한 염부들의 땀과 눈물이 느껴진다. 푸른 연기에 눈물을 흘리면서 긴 솔가지에 불을 붙여 아궁이에 집어던져 불꽃을 맹렬하게 타오르게 하는 과정. 또 철 솥에 부은 함수를 일정한 불 온도를 맞춰서 졸여내어 자염 알갱이를 얻어내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내며 일하던 염부들의 고단한 삶. 그러나 한편 이 솔가지를 태우면서 나오는 푸른 연기를 삼산의 벽파정에서 시를 읊어 음미한 고려시대의 선비도 있으니 같은 푸른 연기라도 신분에 따라 나오는 결과물이 참으로 다름을 느껴본다. 다시 버스를 타고 염포와 장생포를 잇는 울산 최초의 현수교인 울산대교를 건너서 고사(古沙)염분개터를 지나간다. 19-20세기에 걸쳐 야음동에 살았던 심원권이 쓴 일기에 고사(古沙) 염분개에 가서 소금을 사왔다는 기록이 있어 눈길을 끈다. 어쨌든 이 주변에는 모래 사(沙) 자가 들은 마을 이름들이 있다. 예를 들자면 고사, 사평(沙平)같은. 그리고 이제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계속 버스를 타고 처용의 전설이 깃들어있는 외황강 하구를 지나간다. 그리고 강사가 들려주는 마채염전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마채의 뜻은 말채찍이라고 한다. 외황강 상류를 향해서 올라가다 보면 두왕천과 청량천이 만나는 곳에 긴 삼각주가 발달했는데, 그 곳부터가 마채염전이 시작했던 곳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물길을 계속 따라가면 덕하역이 나오고 소 말동이라고 불리우는 여자행상들이 머리에 함지박을 이고 소금을 팔러 다니던 길이라고 한다. 우리 삶의 고단함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음을 느낀다.
지금은 그 염전들이 있던 자리에 한국 경제발전을 이끌어낸 공장들이 세워져있어 옛 모습을 거의 찾아볼 수는 없다. 기억의 저 편에 있던 울산염전에 대한 여러가지 사실과 이야기들을 꺼내서 따스한 강의를 해주신 배성동 강사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그리고 우연히도 마채염전이 있던 자리에서 울산자염의 맥을 현대식 공법으로 이어나가고 있는 한주소금의 무한한 발전을 바란다.
첨부파일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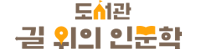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