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인문칼럼] '세미나 융성' 넘어 '문화 융성'으로 /노재현
2013.09.10
1,383
관련링크
본문
[인문칼럼] '세미나 융성' 넘어 '문화 융성'으로 /노재현  노재현
노재현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박근혜정부가 다음 주면 출범 100일을 맞는다. 초기에 인사 진통을 호되게 겪었지만 최근 들어 안정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특히 문화 부문은 전임 이명박(MB)정부 출범 때와 매우 대조적이다. 전반적으로 차분할뿐더러 ‘문화융성’ 국정기조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것 같다. 5년 전 이맘때는 문화예술계 단체장 ‘자진사퇴 종용’ 파문으로 꽤나 시끄러웠다. 당시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새 정권이 들어섰는데도 계속 자리를 지키는 것은 지금껏 살아온 인생을 뒤집는 것”이라며 노골적으로 물갈이를 압박했고, 후폭풍과 부작용이 뒤를 이었다.

지금 정권이라고 유혹이 없겠는가. 진보정권 10년 후 탄생한 MB정권이니 물갈이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지만 자리나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들은 자리가 안 나는 게 불만일 것이다. MB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입장에선 ‘정권 재창출’이라 외치고 싶겠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박근혜정부 시각으로는 재창출이 아니라 그냥 ‘정권 창출’이다. 금융권에 이어 증권가도 교체 바람이 부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진룡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기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다 한다. 하나는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문화예술계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자는 것, 다른 하나는 쇠락해진 우리 사회 정신문화를 고양하는 행정을 펴달라는 것. 전임 정권이 반면교사 역할을 했더라도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13 문화융성 컨퍼런스’에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민예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이 공동주관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런 배경 덕분 아닌가 싶다.
그래서 코드나 이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문화예술의 본령을 살리고 북돋자는 소신 내지 철학이 현 정부에서 구현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문화융성’은 정권인수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하고 써 넣었다는 얘기다. 문화부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고 문화예술계에 활기가 감도는 이유다.
[노재현 칼럼] '세미나 융성' 넘어 '문화 융성'으로
[중앙일보] 입력 2013.05.30 00:28 / 수정 2013.05.30 00:28 노재현
노재현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
지금 정권이라고 유혹이 없겠는가. 진보정권 10년 후 탄생한 MB정권이니 물갈이 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지만 자리나 권력의 속성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 출신들은 자리가 안 나는 게 불만일 것이다. MB정부 때 임명된 사람들 입장에선 ‘정권 재창출’이라 외치고 싶겠지만 어림없는 소리다. 박근혜정부 시각으로는 재창출이 아니라 그냥 ‘정권 창출’이다. 금융권에 이어 증권가도 교체 바람이 부는 것은 그래서일 것이다. 하지만 문화예술계는 소음이 거의 들리지 않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유진룡씨에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맡기면서 두 가지를 당부했다 한다. 하나는 대선 국면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문화예술계 사람들도 포용하고 가자는 것, 다른 하나는 쇠락해진 우리 사회 정신문화를 고양하는 행정을 펴달라는 것. 전임 정권이 반면교사 역할을 했더라도 상당히 신선하게 들렸다. 지난 24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서울에서 열린 ‘2013 문화융성 컨퍼런스’에 보수·진보를 대표하는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민예총(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회)이 공동주관자로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도 이런 배경 덕분 아닌가 싶다.
그래서 코드나 이념 따라 좌고우면(左顧右眄)하지 말고 문화예술의 본령을 살리고 북돋자는 소신 내지 철학이 현 정부에서 구현될지 모른다는 기대를 한다. 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한 ‘문화융성’은 정권인수위의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구상하고 써 넣었다는 얘기다. 문화부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고 문화예술계에 활기가 감도는 이유다.
아직은 문화융성이라기보다는 ‘세미나 융성’ 단계인 것 같다. 최근 내가 참석해 귀동냥을 한 관련 모임만도 3개다. 지난주의 ‘문화융성 컨퍼런스’, 한국문화경제학회가 주최한 ‘문화로 여는 창조경제’ 토론회(4월 25일), 그리고 한국인문학총연합회가 연 ‘인문 진흥을 위한 학술토론회’(4월 19일)다. 이 밖에 문화부·문화관광연구원이 ‘새 정부 문화정책’ 연속 토론회를 벌이는 중이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발족한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정신문화포럼’도 연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그제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달엔 대통령 직속 문화융성위원회도 뜬다.
이런 것들이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 생색내기용 모임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유진룡 장관의 다짐이 실현되려면 말이다. 앞으로 여러 법안·정책들이 나오겠지만, ‘문화가 있는 삶’으로 이어지려면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미리 못박지 말고 국민이 편하게 즐기도록 돗자리를 깔아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돗자리에 관료들이 먼저 올라 춤출 생각일랑 말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문화예술도 즐겨본 사람이 즐기는 법이다.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경험할수록 더 좋다.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온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이 명시되고, 노무현정부에서 하려다 만 ‘문화영향 평가’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전반, 정책 전반에 ‘문화의 옷’이 입혀지는 모습을 희망한다. 돈이 없고 주변 환경이 살풍경(殺風景)인 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삶’은 개개인이 정신적 자생력을 갖추는 삶이다. 얼마 전 재미있게 본 영화 ‘시저는 죽어야 한다’에서 중죄수들이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 연극을 연습하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되도록 많은 국민이 돈과 권력 말고 다른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즐기는 삶이다. 가끔 한눈도 팔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의 국민 행복지수를 측정하니 호주가 3년 연속 1위였고 한국은 저 뒤 27위라는 소식이 바로 어제 보도됐는데, 이런 낯익은 뉴스를 도대체 언제까지 접해야 하는가 말이다.
노재현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
이런 것들이 세미나를 위한 세미나, 생색내기용 모임에 그치지 않길 바란다. “국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닌, 국민이 원하는 행정을 하겠다”는 유진룡 장관의 다짐이 실현되려면 말이다. 앞으로 여러 법안·정책들이 나오겠지만, ‘문화가 있는 삶’으로 이어지려면 정말로 국민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문화이고 예술’이라고 미리 못박지 말고 국민이 편하게 즐기도록 돗자리를 깔아주는 데 주력해야 한다. 돗자리에 관료들이 먼저 올라 춤출 생각일랑 말고.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문화예술도 즐겨본 사람이 즐기는 법이다. 한 살이라도 어리고 젊을 때 경험할수록 더 좋다. 현재 마련 중인 법안에 온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이 명시되고, 노무현정부에서 하려다 만 ‘문화영향 평가’ 제도도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사회 전반, 정책 전반에 ‘문화의 옷’이 입혀지는 모습을 희망한다. 돈이 없고 주변 환경이 살풍경(殺風景)인 계층·지역을 우선적으로 배려했으면 한다.
내가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 삶’은 개개인이 정신적 자생력을 갖추는 삶이다. 얼마 전 재미있게 본 영화 ‘시저는 죽어야 한다’에서 중죄수들이 셰익스피어의 ‘줄리어스 시저’ 연극을 연습하다 내면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처럼, 되도록 많은 국민이 돈과 권력 말고 다른 높은 가치가 있다는 걸 깨닫고 즐기는 삶이다. 가끔 한눈도 팔고 자신을 돌아보는 삶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등 36개국의 국민 행복지수를 측정하니 호주가 3년 연속 1위였고 한국은 저 뒤 27위라는 소식이 바로 어제 보도됐는데, 이런 낯익은 뉴스를 도대체 언제까지 접해야 하는가 말이다.
노재현 논설위원·문화전문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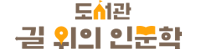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