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인문탐방-문경 새재
옛길, ‘새재’를 찾아!
정진영(안동대 사학과)
길은 길로 이어진다. 길은 이어짐을 그 본질로 한다. 이어지지 않는 길은 막다른 길이다. 막다른 길에서는 더 이상 어찌 해 볼 수가 없다. 그러나 길은 본래부터 없었다. 누군가가 찾은 것이고, 누군가가 만든 것일 뿐이다. 그래서 길이 없다고 탓할 수 없다. 없으면 찾아야 하고, 찾을 수 없으면 만들어야 할 것이 바로 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길은 끝나지 않는다. 하다못해 돌아오는 길도 있게 마련이다. 이것이 길의 본래의 모습이다. 그러나 길에는 도저히 돌아올 수 없는 길도 있다. 저승길이 그것이다. 가기 싫어도, 어느 누구든 꼭 가야하는 길이 저승길이다. 그러나 저승길로 들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지금은.
길은 다양하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고, 우마가 다니는 길이 있다. 대로가 있고, 소로나 골목길도 있다. 산길도 있고, 들길도 있고, 하늘길 바닷길도 있다. 뿐만 아니라 초동이 다니는 길이 있고, 들짐승 다니는 길도 있다. 길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저승길조차도 그러하다. 길을 찾는 사람에게 길을 내어주고, 길을 가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그의 모든 것을 내어준다. 심지어는 이민족의 발길도, 전쟁의 광기도 거부하지 않는다. 그래도 우리는 길을 탓할 수 없다. 그것이 길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길은 얼마든지, 어디든 있기 때문이고, 누구에든 공평하기 때문이다. 인생의 길 또한 그러하다. 오직 자기의 길만을, 하나의 길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길은 길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길 위에는 무수히 많은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멀리는 고구려의 시간도 있고, 신라의 시간도 있고, 조선시대의 시간도 있다. 물론 나라 잃은 설움의 시간도 있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처참한 시간도 있다. 깃발 휘날리는 환호의 시간도 있고, 서로 잡은 손 놓지 못하는 서러운 생이별의 시간도 있다. 그러나 길 위의 하고많은 이 시간들은 잘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벌써 역사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이 길을 찾아 떠난다, 함께. 함께 하는 길은 서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다. 지겹고 힘들면 손잡고 걸으면 된다. 길은 가야할 길이 있지만, 그래도 옆길도 있고, 샛길도 있다. 길 위의 시간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평할 필요도 없다. 시간이 보이지 않는 건 이미 역사가 되어 있음이다. 우리의 걸음걸음마다에도 또 하나의 시간이 쌓이게 된다. 그래서 길 위에서 만나는 시간은 아주 새롭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옛길을 간다. 새재를 넘는다!
‘새재’란 다양한 의미를 가진다. “새도 날아 넘기 힘든 고개”라는 의미라고 한다. 그래서 조령(鳥嶺)이라고 불렀다. 아마 한자로 쓰여 진 것을 근거로 한 해석일 것이다. 추풍령도 “바람도 자고 가고, 구름도 쉬어 간다.”고 했다. 새재는 해발 650m로 사람들이 넘나드는 고개로서는 아주 높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길을 넘고자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늦게 개척된 고개 길이었을 것이다. 늦은 것은 새것이기 마련이다. 아마도 처음 개척되었던 그 당시에는 새로 생긴 고갯길이란 의미로 ‘새 고개’라고 불렀을 것이다. 새재란 다름 아닌 새 고개란 의미의 우리말이다. 새재란 말을 한자어로 표기하다 보니 조령이 되었을 것이다. 새 고개가 열리기 전에는 하늘 재가 있었다고 한다. 문경과 충주를 잇는 길이다. 새재가 열리면서 이 길은 역사의 뒷켠으로 물러나 앉게 되었다. 그러니 새재는 새 고개임이 분명하다.
새재는 조선시대 서울 한양에서 동래에 이르는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길이었다. 그래서 ‘영남대로’라고 불렀다. 조선 8도 가운데 경상도가 가장 컸고, 사람과 물산도 가장 풍부했다. 그래서 영남대로는 조선시대 가장 중요한 길이 되었다. 총 950여 리, 380km에 달한다. 지나는 읍은 68개나 된다. 여기에 또 지선들이 27개나 연결되어 있으니 영남은 물론이고 전국으로 다 연결되는 셈이다.
새재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했다. 관리들이 오가는 관도였고, 양반 유생들의 과거 길이었고, 장인들의 장삿길이었다. 멀리 일본으로 가는 사신들의 길이기도 했고, 세금으로 거둔 곡식을 이고지고 넘던 고생길이기도 했다. 한편으로 파발마가 먼지 자욱이 일으키며 치달리던 길이었고, 임진년에 왜적들이 밀려오던 침략과 약탈의 길이기도 했다.
그러나 문경의 새재는 그 누구보다도 영남의 선비들에게 중요한 길이었다. 새재를 넘어야 서울과 세상으로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면 고루해 질 수밖에 없다. 영남이 세상의 중심이던 시절에는 새재를 넘나드는 선비들의 발길도 빈번했다. 그러나 새재에 영남 선비들의 발길이 뜸해 지면서 영남은 고리타분한 보수의 본향이 되고 말았다. 나아갈 길을 잃고 그냥 안주할 뿐이었다.
이제 다시 길을 나서야 한다! 새재, 옛길에서 인생의 ‘새 길’을 찾아 나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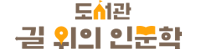







.jpg)
